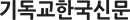연중 이맘때면 라디오 청취율 조사로 관계자들은 초긴장 상태다. 나도 한때 방송사에서 일한 적이 있어서 그 파장과 강도를 누구보다 더 잘 안다. 내가 즐겨듣는 FM 라디오의 음악방송도 예외는 아니다. 나에게 익숙한 진행자의 목소리는 아름다운 음악과 더불어 마음에 안정과 평안을 가져다준다. 시청률과 청취율 전쟁 속에서 울고 웃는 방송사의 생존경쟁은 ‘프로그램 개편’이라는 이름으로 멀쩡한 진행자를 ‘자의반 타의반’ 교체하는 수난을 청취자들에게 안긴다. 나도 그 수난을 직접 경험하여 한동안 허전함과 먹먹함이 가시지 않았다. 정감 있는 목소리로 대중들의 마음을 치유하며 클래식 음악을 배달하던 CBS 음악FM ‘아름다운 당신에게’의 강석우 배우나 깊이 있는 목소리로 클래식의 품격과 아우라를 발하던 KBS 클래식 FM의 ‘가정음악’ 진행자인 김미숙 배우가 그만둔 후의 후유증은 한 달 이상 지속되었다.
《NO 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헨리 클라우드, 존 타운센드, 역자 차성구, 좋은씨앗, 2017)이라는 책이 있다. 저자는 ‘바운더리(boundary, 경계선)’라는 개념을 내세워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관계의 거리를 조명한다. ‘바운더리’란 “인간 내면의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말한다. 이는 순응형(옳지 못한 일에도 “예”라고 대답), 기피형(옳은 일에 대해서도 “안 돼”라고 말함, 지배형(타인의 바운더리를 존중하지 않음), 둔감형(타인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음) 등 4가지로 분류된다. 핵심은 경청과 무시의 긴장 관계인데 ‘무시’를 통해서 확실한 ‘경계’를 세워야 한다는 내용이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린다. 예수는 일단 ‘무시’했다.(Ignoring what they said, NIV, 막 5:36) 그리고 들어야 할 콘텐츠(기준)를 제시하신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Don't be afraid; just believe.) 세상의 소리는 과거의 상처 안에 가둔다. 과거를 헤집으며 상처를 들쑤신다. 이전의 실수를 끄집어내어 ‘두 번’ 죽인다. 과거가 현재를 망친다. 예수를 둘러싼 사람들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며 통곡한다. 반면에, 예수는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맞추신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선포하신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는 예수가 병자들을 치유하신 목적이며 표적(sign)이다. 예수는 치유를 통해 ‘무시’와 ‘경계’를 명확히 하셨다. 그래서 치유의 이적은 ‘땅의 기적’이 아닌 ‘하늘의 표적’이다. 이적을 무시하고 표적을 수용하는 것이 진정한 경청이다.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의 파급효과가 훨씬 크다. 나쁜 말은 3배 빨리, 7배 멀리 퍼진다. 좋은 말이 3명에게 전달되는 시간에 나쁜 말은 33명에게 전해진다는 실험 결과도 있다. 요즘 정치 양극화 시대에 유튜브를 비롯한 SNS를 통한 각종 정치 이슈들이 영상화되어 하루에도 수만 건이 쏟아져 나온다. 이는 휴대폰의 저장 용량에도 지장을 주지만 보고 듣는 이의 뇌와 멘탈에 주는 영향이 더 심각하다.
“멍청한 열심과 경계 없는 경청은 바보로 가는 지름길” 이는 내가 35년 동안 강의하며 가르친 경험칙 중의 하나다. 왜 남의 말을 무시하지 못하는가? 예민해서 그렇다. 예민한 성격은 경계 없는 집중을 부채질해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충동적 자해와 때로는 자살을 낳는다. 합리적 솔루션은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있다.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하며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관건이다.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들려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화자의 진정성과 딜리버리(delivery, 전달력)의 전문성은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를 것은 거르는 ‘컷(cut)’의 훈련, 즉 긍정적 의미의 ‘둔감력’이 필요하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수용해야 할 것과 흘려들어야 할 것의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며 현장에 적용할 ‘생활 복음’이다.
많은 사람이 경청에 목숨을 건다. 그러나 경청이 핵심 아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하다. 세상의 쓰레기 정보를 거르는 능력을 길러라. 진리가 아닌 말을 무시하라. 무시는 단호한 거절의 훈련에서 나온다. 거절은 수락만큼 중요하다. 19세기 미국의 신학자이자 정치개혁가였던 제임스 프리먼(James Freeman, 1810~1888)은 “정치꾼(politician)은 다음 선거만 생각하지만, 정치가(statesman)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라고 했다. 나는 정치꾼에게 듣는가, 아니면 정치가에게 듣고 있는가.
본지 논설위원, 한국교육기획협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