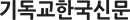기독교 미래학자이면서 미국 드루대학교 석좌교수인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 1961~)의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윤종석 역, IVP, 2004)에 나오는 이야기다. 어떤 청년이 커피 맛으로 소문난 카페를 어렵게 찾아갔다. 문은 닫힌 채 “점심 먹으러 외출 중. 1시 30분에 돌아옴”이라는 메모가 붙어있었다. 추가된 메모가 눈에 띄었다 “가게 팔려고 내놓음. 목이 좋아 전망 있음” 이 카페는 얼마 후 망해서 아예 문을 닫았다. 스위트는 이유를 두 가지로 분석했다. 하나는 남의 필요보다는 자신의 배부터 채운 이기심이다. 또 하나는 가게 주인이 ‘현장’을 떠나있다는 발상이다. 진짜 장사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주인의 전문성을 고객에게 파는 것이다. ‘나의 전문성’으로 ‘남의 필요’를 돕는 게 장사와 기독교 선교의 본질이다.
스위트는 2024년 한국에서 선교적 교회의 ‘MRI 체계’를 주창했다. 마태복음 28장 18~20절을 이렇게 분석한다. “‘너희는 가서’는 선교적(Missional), ‘제자로 삼아’는 관계적(Relational), ‘모든 민족을’은 성육신적(Incarnational) 사명이다.” 즉, 세상으로 가서(M)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고(R) 다양한 문화를 반영하라는(I) 의미다. 특히, “한국 교회는 세상으로 가기(Go)보다는 교회 안으로 오라(Come)고 한다. 이는 성육신의 낮은 자세가 아닌 식민주의의 강압적 자세다. 교회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데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한다.
대학입시와 취업시험 성적을 올리는 두 가지 코스가 있다. 첫째는 기본 이론, 둘째는 문제풀이다. 원칙상 기본 이론에서 시작하여 문제풀이로 가는 게 맞다. 물론 기초와 기본기가 중요하다. 하지만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할 때는 바로 문제풀이로 직행한다. 문제와 정답을 달달달 외우고 반복하여 합격한다. 이론만이 능사는 아니다. 문제를 직접 풀면서 경향과 원리를 터득한다. 기초 쌓는 데만 허비하기 보다는 현장에서 문제풀이 할 때 실력이 올라간다. 선교는 현장이다. 현장으로 들어가서 문제풀이 해야 한다. 현장으로 가서 문제와 부딪히라.
요한복음 9장에는 예수가 선천적 시각장애인을 낫게 하는 장면이 나온다. 방식이 비위생적이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른다. 독일의 루터교 신학자인 벵겔(J. A. Bengel, 1687~1752)은 이렇게 해석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진흙을 사용한 것처럼 예수님도 진흙으로 새 눈을 주셨다. 예수님의 창조적 능력이다.” 또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다. 당장 고쳐주시지 않는다. ‘보냄을 받았다’는 실로암의 의미대로 현장에 가야 기적을 이룬다. 현장은 순종의 자리다. 순종 끝에 기적이 있고 기적 끝에는 복음이 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으로 치유의 목적을 설명한다. 현장에 가야만 하나님의 일이 성취된다. 기적(miracle)이 아니라 표적(sign)이다.
예수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충분히 준비가 안 된 제자들을 둘 씩 짝지어 파송하셨다. “잃은 양에게로 가라”며 바로 ‘문제풀이’에 투입하셨다. 실전 훈련을 시키기 위함이다. 사명의 현장으로 가야한다. 너무 오랫동안 이론에만 매이면 생각의 틀에 갇힌다. 책이나 뒤적거리다가 편협해지고 급기야는 편함만 추구한다.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현장에 답이 있다. 깨지면서 성장한다.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면서 성숙해진다. 그래서 교회는 ‘광야교회’며 선교지는 ‘광야’고, 선교사는 ‘광야꾼’이다.
왜 영화 제목이 ‘변호사’가 아닌 ‘변호인’인가? 돈이나 밝히면 ‘변호사’에 머문다. 억울한 의뢰인을 발품 팔아 만나야만 비로소 ‘변호인’이 된다. 좋은 의사는 환자를 가까이 한다. 훌륭한 목회자는 ‘앓은 양’을 기꺼이 만난다. 잃은 양에게로 가는 정신이 목회다. 한국 교회의 스승 한경직 목사도 바른 설교를 하기 위해 심방을 통해 많은 성도들을 만났다. 만남이 사역이다. 책과 강의만이 아닌 사람을 만나라.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면 사역이 시작된다.
사도행전의 원제가 ‘Acts’(행동)다. 베드로, 바울, 스데반, 야고보는 현장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다.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적과 표적이 뒤따랐다. 그래서 ‘헌심(獻心)’이 아니라 ‘헌신(獻身)’이다. ‘헌심예배’가 아닌 ‘헌신예배’다. 마음이 아니라 몸이다. 교회가 안전지대에 머무르면 능력을 잃는다.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는 안전하지만 정체성에 어긋난다. ‘배의 배됨’은 파도치는 바다로 나가는 데에 있다. 종은 울려야 종이다. 힘든 현장으로 나가라. 고난 속으로 뛰어들라. 교회를 역동적으로 생명력 있게 바꾸는 길은 현장에 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막 16:20)
본지 논설위원, 한국교육기획협회 대표